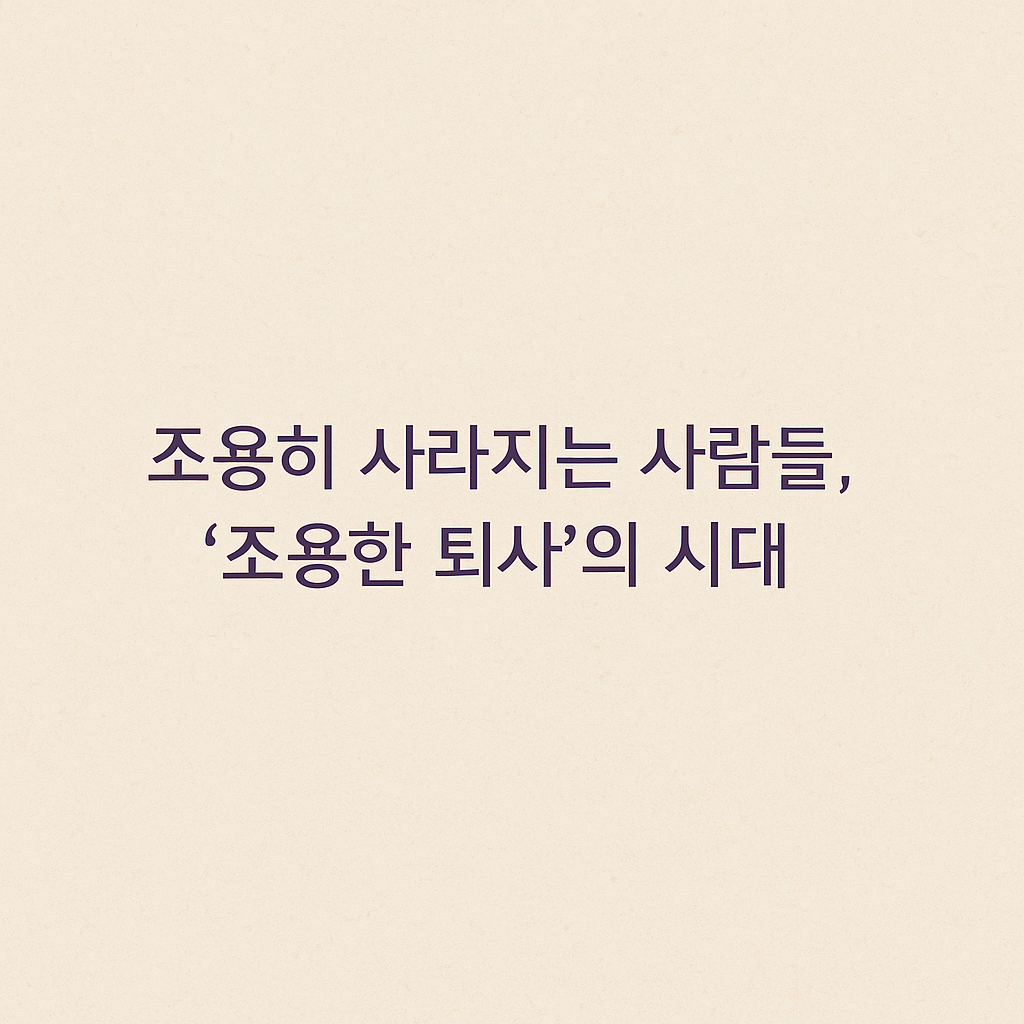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조용한 퇴사'의 시대
출근길 지하철 안.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멍하니 들여다본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일은 그저 생존을 위한 ‘버티기’일 뿐이다. ‘조용한 퇴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자화상 같은 말이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말은 끝났다
예전에는 그랬다. 상사 눈에 잘 보이려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회사 채팅방에 남아 있었고, 주말에도 업무 생각을 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이 더 중요해졌다.
조용한 퇴사는 말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를 뜻한다. 출근은 한다. 할 일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열정’을 기대하지 마라. 그저 ‘정해진 만큼만’ 일할 뿐이다.
MZ세대가 택한 새로운 생존법
MZ세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상사의 눈치보다 자신의 삶의 질을 우선순위로 둔다. 승진보다 워라밸, 성과보다 건강, 열정보다 자존감을 택한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비난한다. “게으르다”, “회사에 애정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내가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 두렵다”고.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오래 남는다.
조용한 퇴사, 그 이면의 감정들
조용한 퇴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말한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퇴사했다.” 그 말이 주는 씁쓸함은 이 사회의 피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열정은 지쳐버렸고, 책임감은 무력해졌으며, 미래는 불투명하다.
어떤 날은 퇴근 후 방에 누워 눈물이 난다. 이게 맞는 삶일까. 그런데도 또 아침이 오고, 다시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조용한 퇴사를 막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조용한 퇴사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다. 직장 내에서 소통이 사라지고, 상사는 이해보다 지시를 앞세우고, 직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에서는 결국 모두가 지쳐간다.
진짜 필요한 것은 ‘리더의 변화’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변화가 시작될 때, 조용한 퇴사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열심히 하지 마라’는 게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이 내어주지 말자는 말이다. 당신의 열정, 건강, 자존감은 회사가 아닌, 당신만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용한 퇴사.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그저 조용히 버티는 중인지도 모른다.
※ 이 글은 202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감성 에세이 형 블로그 글입니다.